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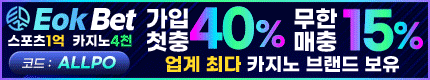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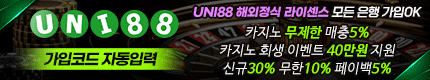 |  | |
뉴스
[기자수첩]'포스트 김연경' 시대 만난 女배구, 선수층 강화 묘수 찾아야
드루와
0
06.14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100년에 한 번 나올 선수"라는 평을 듣던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의 여정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지난 8~9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대표팀 은퇴 경기는 17년 간 태극마크를 달고 헌신한 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을 마친 뒤 대표팀을 떠난 김연경의 뒤늦은 은퇴식에는 국내 V-리그 선수들은 물론 해외 배구 스타들까지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성대한 '마지막 축제'는 김연경이기에 가능했다. 국내 배구선수가 대표팀 공식 은퇴 경기를 치른 것은 김연경이 처음이다. 그만큼 김연경은 한국배구에서 특별한 선수였다. "한국 여자배구가 꽃을 피우기까지 어떻게 보면 연경 언니가 멱살을 잡고 끌고 왔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양효진(현대건설)의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김연경에게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는 '딱 맞는 옷'이었다. 2000년대 여자배구 영광의 순간에는 늘 김연경이 있었다. 2012 런던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4강 진출을 이끌었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도쿄올림픽 도미니카공화국과 경기서 한국이 수세에 몰리자 "해보자, 후회 없이"라는 말로 선수들을 독려한 장면은 깊은 울림을 줬다.
아쉽지만 이제는 작별을 준비할 시간이다. 이제 태극마크를 단 김연경은 없다. 애석하게도 김연경을 중심으로 영광을 함께했던 황금세대와의 이별과 동시에 한국 여자배구는 국제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
최근 2년 연속 한국 여자배구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에서 12전 전패의 수모를 겪었다. 우려를 잔뜩 안고 나섰던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5위에 그쳤다. 여자배구가 아시안게임 시상대에 서지 못한 것은 2006년 도하 대회(5위) 이후 17년 만이다.
국내 프로스포츠의 인기는 대부분 국제 대회 성적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 여자 배구가 남자부의 인기를 추월한 것도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 덕분이었다.
V-리그에서도 '김연경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2022~2023시즌부터 김연경의 현역 연장 여부가 큰 뉴스가 될 만큼 선수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2024~2025시즌엔 코트에 서기로 했지만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그의 공백을 누가 채울 수 있을지 아직은 짐작조차 어렵다. V-리그에 여러 스타들이 있지만 김연경의 자리를 대체하기엔 아직 부족한 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당장 김연경급 잠재력을 갖춘 선수가 '깜짝' 등장하길 기대하는 것은 그저 요행일 뿐이다. 어느 정도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도에 가깝다.
장기적으로는 수년전부터 논의 중인 2군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막대한 운영비를 쏟아 붓는 구단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선수층을 강화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투자와 운용이 뒷받침 돼야 새로운 선수 발굴과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배구의 미래인 유소년 배구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다. 여자 배구가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배구의 선수층부터 다져놔야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길게 보고 한국 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숙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김연경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김주희 기자
네임드, 알라딘사다리, 가상축구, 슈어맨, 총판모집, 먹튀폴리스, 프로토, 네임드사다리, 토토, 먹튀검증, 네임드달팽이, 올스포츠, 로하이, 해외배당, 네임드, 라이브맨, 스코어게임,
0 Comments


